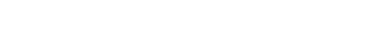= 지난해 11월 호주 시드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호주의 대중교통을 구석구석 오가며 해외 다른 국가의 철도, 그리고 교통 역시 살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호주의 교통, 그리고 철도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 <2번출구> 연재를 이어 나갑니다. =

[철도경제신문=박장식 객원기자] 호주 시드니 여행을 했다고 하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오페라하우스'를 보았는지 부터다. 이렇게 시작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 다리까지 이어진다. 시드니 시내의 해안가 어디에서라도 보이는 이 다리. 존재감이 '에펠탑' 못지않다. 현지 사람들에게는 '옷걸이 다리'라고 불리는 하버 브리지 이야기이다.
하버 브리지는 시드니의 남북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일 엄청난 수의 자동차와 시내버스가 오가고, 사람들도 걸어서 다닐 수 있다. 그런데 이 다리에 철도도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을 테다. 하버 브리지는 걷는 사람부터 자전거, 심지어는 '2층 열차'까지. 땅 위를 다닐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이 오가는 장소다.
이제는 시드니 곳곳에 해저터널이며 교량이 더욱 많이 설치되면서 위용을 잃을 만도 하지만, 여전히 시드니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다리가 하버 브리지다. 그런 하버 브리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시드니로 끌려온 건축가, 다리를 생각하다
처음 시드니가 개척되었을 때 이곳을 처음 밟은 인물이 있다. 그의 이름은 프란시스 그린웨이. 화폐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시드니에 '유배'된 그는 건축가라는 본업이 따로 있었다. 그 본업을 호주에서도 살렸는데, 그가 설계한 건물들은 지금도 호주의 중요 문화재로 남아있곤 하다.
프란시스 그린웨이는 1825년 <The Australian> 신문에 특별한 제안을 한다. 시드니만을 잇는 다리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그는 <The Austrailan>에 "식민지와 모국에 대한 신용, 그리고 영광을 반영할 힘과 웅장함을 주는 아이디어가 될 것"이라며 시드니 남북을 잇는 다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의견은 많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1000m가 넘는 다리를, 그것도 깊은 바다가 있는 복잡한 만 사이에 짓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니 별의별 대안이 쏟아졌다. 조선기사(造船技士)였던 로버트 브린들리는 이른바 시드니만을 잇는 '배다리'를 짓자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그 제안은 당시 무역항이었던 시드니의 숨통을 끊는 것이었기에 비판 속에 사라지기도 했다.
그러던 도중 19세기 말 트러스 구조의 다리를 짓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이 나왔다. 트러스 구조는 당대 에펠탑에서도 사용되었을 정도로 꽤 합리적인 대안이었다. 건설비 역시 시드니의 랜드마크를 짓는다는 측면에서도 고려한다면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새로운 다리는 트러스교로 짓는 걸로 결정됐다.
다리가 지어져야 할 이유도 있었다. 당시 호주는 새로운 '중앙역'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었다. 새로운 '센트럴 역'을 거쳐 시드니 북부, 나아가 브리즈번과 다윈까지 한달음에 잇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드니만을 꼭 지나가야만 했다. 그렇게 시드니 중앙을 잇는 다리가 지어지기로 결정되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다리의 건설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첫 구상이 나온 지 거의 백 년 만의 일이었다.
'호주의 토박이', 자랑스러운 다리를 만들어 내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를 만들 차례였다. 다리를 만들 총책임자로 존 브래드필드가 임명되었다. 브래드필드는 1867년 퀸즐랜드에서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 시드니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호주의 토박이'였다. 식민지 시대, 사람의 이동이 어느 때보다 많았던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이력의 소유자였다.
존 브래드필드는 먼저 도심 철도의 지하화를 계획했다. 브래드필드는 이른바 시드니만 관통 교량의 건설 조건으로 센트럴 역의 개설, 그리고 교량 구간과 센트럴 역 사이의 철도를 지하 철도로 건설해 도심 환경을 개선하자는 제안을 했다. 결국 현재 호주 도심의 철도가 현재 모양새를 갖도록 한 장본인이 브래드필드가 된 셈이었다.
다리의 모양 역시 참고해야 했다. 시드니만을 잇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각이 없거나 최대한 길어야 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철교 '헬게이트 브리지'가 그의 마음에 쏙 들어왔다. 복잡하면서도 바닷속을 지나기에 다리를 짓는 데 불편한 뉴욕 해협을 310m의 헬게이트 브리지는 아치 트러스 형태로 지나갔다.
하지만 시드니 해협은 뉴욕보다도 깊고 넓었다. 그 모양을 키우면서도 안정성을 높여야 했다. 자연스럽게 교각의 크기도, 교량의 너비도 커졌다. 공사에 신중을 기해야만 했다. 교량의 남북에 먼저 커다란 교각이 설치되었고, 여기에는 커다란 놋쇠 판이 아치와 다리의 무게를 나누기 위해 얹어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커다란 교각 위에 아치를 얹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1928년 10월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치 공사는 남쪽 교각에서 먼저 시작했고, 이윽고 북쪽 교각에서도 작업이 시작되었다. 남쪽 아치는 북쪽 아치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올려지는지 바라보는 역할도 함께 맡았다.
공사는 위험의 연속이었다. 아치 아래는 천길만길 바닷속이었고, 그 아래 바다 위에는 여러 배가 지나가곤 했다. 하지만 결국 아치를 연결하는 작업은 성공했다. 아치 공사가 시작된 지 2년도 채 안 된 1930년 8월 19일, 두 아치가 연결되는 데 성공했다.

가장 어려운 아치 공사가 끝났으니 다리 상판 작업은 어렵지 않았다. 왕복 4차선의 도로가 설치되고, 노면전차와 철도를 위한 선로가 양쪽 끝에 가설되었다. 마침내 1932년 1월 19일, 존 브래드필드를 태운 시험 열차가 큰 기적소리와 함께 시드니의 양안을 관통했다. 시드니의 역사가 된 다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1932년 3월 19일 거행된 개통식. 개통식에서는 한 남자가 내빈보다 먼저 테이프를 끊어 체포되는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모두가 시드니의 양안을 잇는 첫 다리의 탄생에 모두가 환호했다. 특히 이 다리는 호주가 공공재정을 투입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한 사례이기도 했다. 미국에 후버 댐이 있었다면 호주에는 하버 브리지가 있었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이 다리는 "The Iron Lung", 한국어로는 '철로 만든 폐'라는 이름으로 한동안 불렸다. 하버 브리지는 호주의 교통 역사를 넘어, 호주의 경제사에도 족적을 남긴 셈이다.
'백 년 다리', 시드니 하면 떠오르는 상징으로
하버 브리지는 개통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 시드니 남북을 잇는 노면전차는 광역철도 '시티레일'에 흡수되었고, 증기기관차가 오가던 하버 브리지에는 이제 관광객과 직장인들을 가득 실은 2층 열차가 바삐 오간다. 시드니 남북을 잇는 가장 중요한 다리인 만큼 출퇴근 시간이면 북새통이 되는 통에 차선을 유연히 조절하는 가변차로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하버 브리지를 건너는 열차를 타고 이 '철로 만든 폐' 위에 오르면 덜컹대는 소리보다는 응접실 위에 앉아 있는 듯 보드라운 소리가 탑승객을 감싼다. 바로 옆 도로, '브래드필드 하이웨이'에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모습을 함께 보면 시드니 바다 위를 공중에서 내달리는 듯하다.

그리고 열 번 남짓 강산이 바뀐 시간만큼이나 시드니의 풍경도 바뀌었다. 공사 당시 납작했던 시드니의 시티는 이제 수십 층 건물이 올라와 빽빽한 도심을 이룬다. 그런 도심을 배경으로, 새해 행사 때면 하버 브리지에서는 언제나 큰 불꽃이 터지며 새해를 축하하곤 한다.
하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 관광객들은 호주에 왔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기 위해 백 년 전에도, 현재에도 하버 브리지를 들른다는 사실 말이다. 그리고 호주, 특히 시드니 시민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까지 길이 남을 명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한다. 하버 브리지는 다른 랜드마크와 비교가 어려운 시드니의 '대표작'이다.